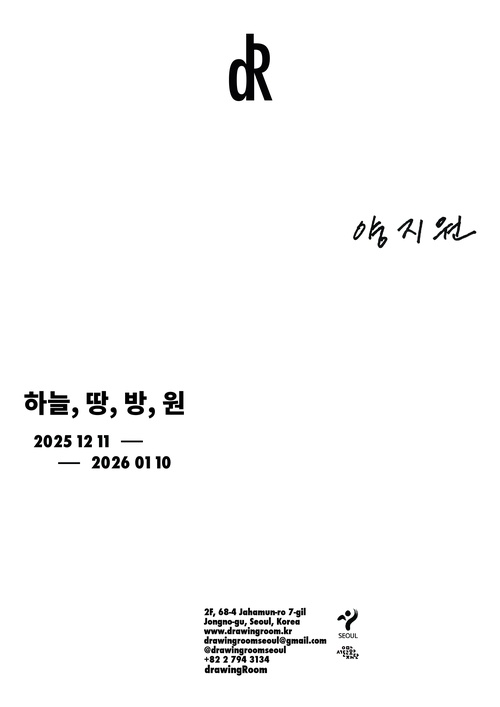사진책전시지원 23 유석 사진전 : 아무것도 아닌 일들
사진위주 류가헌
2017년 6월 13일 ~ 2017년 6월 18일
보도블록 위에 흩어진 돌 부스러기. 등 닿는 부분이 헤진 지하철의 의자 등받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의 비둘기 한 마리, 벽의 갈라진 틈새에 덧바른 시멘트... 읽어도 그 안에 어떤 함의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문장들처럼, 여기 ‘아무 것도 아닌’ 대상들이 담겨 있는 일련의 사진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는 사진 제목처럼 평범한 사물과 현상이 찍혀 있을 뿐 극적이거나 결정적인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지극한 일상성만이 가득하다.
그러자, 역설적으로 자꾸만 의미를 찾게 된다. 사진 속 사물들 사이 어딘가에 숨겨진 의미나 감춰진 작가의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사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뜻이나 가치를 헤아려 의미 있음과 없음을 가리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다. 유석의 사진 속 사물들 역시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놓인 위치나 상황에 의해서 쓸모없거나 버려진 것, 즉 무의미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 것들이다. 그런 이미지들이 중첩되고 종합되며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시 인식되어 진다.
‘우리가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가? 무의미한 것은 정말 쓸모없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이 사진들의 시작에 있었던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겪은 사회적 사건 하나와 작가가 홀로 겪은 개인적 사건, 이 두 ‘큰’ 사건에서 파생되었다. 다음은 작가 유석의 작업노트다.
‘2014년 봄.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은 이 사회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시기 나는 폐결핵이라는 질병으로 사적인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가는 존재들에 눈길이 멈추었다. 그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버려진 것들 대한, 잊힐 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카메라를 들게 만들었다.’
사진가 김홍희가 유석의 사진들을 두고 “지루하고 남루한 일상의 버려지고 폄하된 이미지들을 동원해 의미와 무의미를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거대한 것에 대한 돌팔매질”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석은 또한 말한다. “나는 바란다. 당신이 의미와 무의미의 근본적인 질문 속에 헤매기를.”이라고. 사진을 보는 이들도 각자 의미와 무의를 구분하는 경계에 ‘돌팔매’를 해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동일한 제목의 사진집과 전시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류가헌 전시 1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사진위주 류가헌
* 아트바바에 등록된 모든 이미지와 글의 저작권은 각 작가와 필자에게 있습니다.참여 작가
- 유석